하버드 의대생 절반은 창업,
그렇다면 서울대 의대는 어떨까

대학만 가면 진로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줄 알았는데, 4년이 다 흘러간 뒤에도 '내가 진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 지원할 때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가장 간판 좋은 학교'를 고른 것처럼, 졸업 후에는 당장 나를 받아주는 회사 중에 가장 연봉과 직원 대우가 좋은 곳을 골라 입사하기도 하죠.

무려 6년 동안 집중적인 전문 교육을 받는 의대생들은 이런 고민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졸업 후 국가고시를 치르고 바로 일반의로서 개업을 할지, 대학병원에 남아 인턴을 하고, 전공을 정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될지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리라는 사실만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의대생은 입학과 동시에 대략적인 진로가 정해질거라는 이런 추측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어느정도 들어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사례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하버드 의대생들

미국의 시사 전문지 가 발표한 랭킹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의대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입니다. 하버드 의대는 연구업적, 위치, 학비, 학교의 크기 및 입시 성적 등의 모든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특히 임상의학보다는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연구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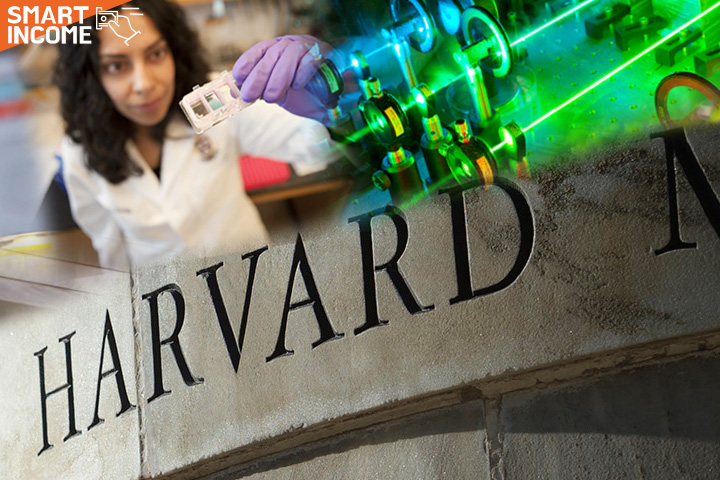
이런 학교 자체의 분위기 때문인지, 하버드 의대 졸업생들 중 창업을 준비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박한수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공학과 박한수 교수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의대 졸업자들이 바이오헬스케어 창업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박사 후 과정을 하버드 의대에서 이수한 그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하버드 의대 박사과정 학생 중 절반은 창업이나 연구의 산업화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죠. "하버드 의대 심장내과 스타 의사가 구글로 옮겨 바이오 자회사 책임자를 한다"고 실제 사례를 들며 미국에서 의료기술이 어떻게 산업화되고 있는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의대는 어떨까

박 교수는 "서울 의대 졸업 동기 200명 중에 창업으로 진로를 정한 사람은 단둘"이라고 말합니다. '의대에 진학했으면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 한국 사회 전반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 청소년 시절을 모두 공부에 헌납하고 신체적 피로·정신적 스트레스와 힘들게 싸워온 만큼, 안정된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든 한국의 현실
힘들게 공부해서 의대에 가고 우수한 학생들만 모인 의대에서 전력을 다해 경쟁하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면 어째서 두 학교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한국의 창업 환경이 특별히 척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민간 차원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죠.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을 잘 활용하면 최대 9억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자본금 부족이라는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대생들의 관련 사업 진출 비율이 낮은 것은, 한 번 실패하면 재투자를 받을 수 없어 재기가 어려운 한국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패를 겪더라도 경험을 쌓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투자자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도전'은 격려하되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실패 역시 경험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계 시스템의 부재

작년 5월, 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제2회 '미래 의사과학자 진로 모색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주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23명의 젊은 임상의가 참여해 6박 8일 동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바이오 클러스터들을 돌아보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일 전임의는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와 임상을 사업화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고 연수를 마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의학적 지식에 대한 공유에 그치지 않고 연구·임상을 넘어 이를 사업화하고 특허나 펀딩 과정,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 창출까지를 담은 이런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는 없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죠.
교육현장에서 기울이는 노력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 논리와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시스템의 부재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례를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달라질 날이 오겠죠. 한국의 의대 및 의료계에서도 의대 졸업생들의 창업 및 진로 개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서울 의대 해부학 교실에서 조교수를 맡고 있는 최형진 교수는 3D 프린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의료에 접목·체험할 수 있는 '해부 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과목을 강의합니다.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고, 기업과 의대생들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졸업 후 창업을 염두에 두거나 신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죠.

최 교수는 "의대생들은 임상의가 아닌 미래 의료를 이끄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관련 과목을 만들어 달라고 학과에 요구하거나 방학 등을 이용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찾아가 인턴 연구원으로 일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의대는 'SNU Medical Dream of Nobel Prize and Start-up'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필드에서 활동 중인 강연자들이 '의학에서의 나노의 역할',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려면'등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무작정 뛰어드는 창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육과 산업을 적절히 연계하고, 실패로 인한 손해를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임상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기술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형진 교수의 말처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심장수술 집도의'가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서울 의대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