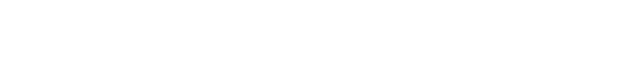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선 스페인의 한 생물학자가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담긴 이미지가 화제입니다. 이미지 하단에는 "당신들은 축구 선수에겐 매달 수 십억의 월급을 주면서 생물학자에겐 몇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죠. 그러더니 이제 우리에게 와서 치료제를 달라고 하네요? 호날두나 메시에게 가서 치료제 좀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라고 적혀있는데요.
한 장의 이미지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명과학 분야와 관련 종사자들의 낮은 연봉을 시사한 것입니다. 반대로 스포츠 스타, 연예인의 비정상적인 수입 구조를 비판했는데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산 이미지지만 사실 이는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스페인 전 농림 수산 식품환경부 장관 이사벨 가르시아 테제 리나였죠. 그녀는 축구선수를 향한 비판을 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럼에도 해당 이미지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학자, 생명과학 종사자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 그대로 '박봉'인 직업군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과 = 취업 깡패? "전화기 빼고 똑같아요"
현재 생물학과 생명과학은 그 의미가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생물학은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며 생명과학은 분화된 생물학의 연구 대상을 통합하여 생명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인류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같은 이과 계열이어도 생명공학과 전공자들은 '전화기(전기 전자·화학 공학·기계 공학을 일컫는 말)'전공을 제외하곤 취업난을 겪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일반적으로 교수,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술직 공무원, 민간 기업 취업 등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이 대표적인 관련 민간 기업이죠. 일반적으로 제약 회사 취업이 쉬울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약사, 수의사 등 면허는 물론 박사 학위까지 따야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 결과 재학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위해 대학원을 가거나 문과생들과 7,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등의 돌파구를 찾기도 하죠. 일부 학생들은 의대, 약대로 눈을 돌려 PEET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생명과학 = 고 스펙 저 연봉? 평균 연봉은‥
그렇다면 생명과학과 재학생 사이에서 떠도는 '생명과학 = 박봉 직업군'이라는 소문은 사실일까요? 2019년 7월 워크넷 직업정보에 의하면 생물학 연구원의 평균 연봉(중윗값)은 4,644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25%의 경우 5,954만 원까지 올라갔죠. 학력별 연봉 격차 역시 생물학 연구정보 센터(브릭)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정규직 기준 학사급 평균 연봉은 3,660만 원, 석사급 4,040만 원, 박사급 5,346만 원 정도였죠.
같은 이공계 분야의 직군보다 연봉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재직자들은 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포화 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한 해에 뽑을 인원 자체가 많지 않고 국내 기술 수준 역시 크게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비교적 작은 채용 시장 규모에 비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생명과학 관련 학과 신입생을 매년 모집하고 있어 인력 포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시는 1초에 5,600원, 연봉 비교해보니
생물학자와 함께 언급됐던 축구 선수의 연봉을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연봉, 광고 수입,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은 돈을 번 축구선수는 리오넬 메시였는데요. 한화로 1,7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를 초당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1초에 약 5,600원을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598억 원), 네이마르(1,275억 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약 37억 원에 달했죠.
토트넘 간판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주급 14만 파운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K리그 구단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발표했는데요. K리그 1 구단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9,911만 4천 원이었죠. 국내 선수 최고 연봉 1~5위는 전북 김진수(14억 3,500만 원), 전북 신형민(10억 4,550만 원), 전북 이동국(10억 1,054만 원) 순이었습니다. K리그 2 9개 구단의 1인당 평균 연봉은 8,940만 1천 원이었습니다. 분야는 물론 연봉이 공개된 종사자들의 연차, 경력이 다르기에 생명과학 종사자, 축구선수 두 직업군을 확실히 비교할 순 없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이공계 고급 인력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물학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과학기술인들은 해외 취업 시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브릭에서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만약 앞으로 1년 안에 취업해야 한다면 국내와 국외 중 어느 지역을 우선 선택하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7%가 해외 취업을 택했습니다. 연기 시설과 환경, 처우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었죠. 한 연구자는 식품산업, 바이오 계통은 박사급이 돼야 4~5천만 원 정도의 초임을 받는다며 대졸 은행원, 일반 기업 사원과의 연봉을 비교했습니다.
실제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공개하는 두뇌유출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0점 만점에 4.0점으로 조사 대상 63개국 중 4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재 유입보다 유출이 많다는 기록인데요. 최근 정부에선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일해 군 복무 대체하는 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은 해외 대학원 진학, 취업 등으로 이어져 해외 두뇌 유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