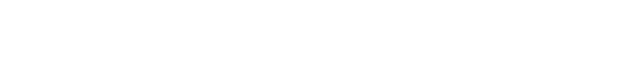10여년 만에 경쟁률 30대1 미만 기록
인사처는 ‘인구감소’, ‘코로나’, ‘연금’ 말하지만
진짜 이유 ‘조직 문화’에 숨어 있다?
‘“목표는 9급 공무원”…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도 줄섰다’
‘청년 취준생 10명 중 3명은 공시족’
‘“수능 대신 공시!” 대학 안 가고 9급 공무원 되겠다는 10대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공무원 시험 열풍을 짐작하게 하는 기사 헤드라인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식지 않을 것 같던 9급 공무원 인기가 요즘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열풍을 다룬 2017년 방송 보도 중 일부. /SBS 뉴스 캡처
인사혁신처는 5672명을 뽑는 2022년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총 16만5524명이 지원해 2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2011년 93대 1을 기록한 이후 가파르게 하락세에 들어섰습니다. 100대 1에 육박하던 경쟁률이 불과 10여년 만에 30대 1 미만으로 뚝 떨어진 것이지요.
최근 5년간 9급 공무원 경쟁률을 볼까요? 2018년 41대 1,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2021년 35대 1로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30 인구 감소’, ‘공무원 연금 개편’,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히 이해되지는 않는 분석이지요. 코로나19 이전에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여전히 취업 한파가 불어닥치는 마당에 단순히 인구 감소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시들해진 공무원 인기는 결혼정보회사 조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조사한 ‘2021년 이상적 배우자상’에서 이상적인 아내 직업으로 ‘일반 사무직(40.8%)’이 ‘공무원(40.2%)’을 제쳤습니다.
근소한 차이이지만 전통적으로 결혼 선호도가 높은 직업으로 여성은 공무원이 늘 으뜸으로 꼽혔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자는 공무원’이라는 공식이 깨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성에게도 대기업 사무직처럼 안정성은 떨어져도 소득이 높은 직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잡스엔이 2030 취준생과 직장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30대 남성 직장인은 다소 솔직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고를 수 있다면 전문직이나 중견기업 이상에 다니는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요. 결국 ‘여자 공무원이 결혼하기 좋다’는 말도 여자가 애 키우기 좋은 직장이라는 건데, 저는 딩크족(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으로 살고 싶거든요. 둘이 많이 벌고 재밌게 쓰면서 사는 삶을 꿈꿉니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이상적인 여성 배우자 직업에서 ‘공무원’이 1위 자리를 내줬다. /듀오 제공
3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20대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취업 자리 찾기가 어려워요. 기업 공채도 요즘은 많이 줄었고요. 그나마 공무원은 꼬박꼬박 채용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9급 공무원 초봉을 본 적이 있거든요. 월세 내고 생활비 감당하면 한 푼도 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30년 뒤 받을 연금 생각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살기엔 젊은 날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지만요(웃음). 요즘은 학원에 안 다니면 합격도 어렵잖아요.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돈도 무시할 수가 없죠.”
현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정년 퇴직을 생각해봤을 텐데요. 어렵게 시험을 통과해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5세 이하 퇴직자는 5961명이었습니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17년 4375명에 비해 1600명이나 늘어난 수치죠. 특히 전체 퇴직 공무원 5명 중 1명 꼴로 5년 미만 재직자로 조사됐습니다. 젊은 공무원 퇴사가 이어진다는 신호입니다.
2018년 입직했다가 퇴사한 전직 공무원 김모(29)씨는 “조직문화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너댓 시간씩 자면서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단기간에 시험에 붙었어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윗사람들은 업무 미루기에 바쁘고, 결국 신입인 제가 민원인 응대를 도맡아 했죠. 예전 선배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공무원을 세금 도둑 취급하고 막말을 하는 민원인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고요. 업무 영역 중 하나인 엑셀도 잘 못 다뤄서 일을 미루는 상사가 나보다 연금도 더 많이 타 간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억울하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답이 없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공인 경영을 살려 스타트업쪽으로 지원할까 합니다.”
현직 7급 공무원인 A씨(34)도 한 마디 보탰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안정성만 보고 직업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후회하고 있어요. 동기들도 비슷하게 가늘고 길게 가자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맞벌이 하며 아이는 제가 거의 돌보는데 물론 아이 키우기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죠. 그런데 독박 육아를 하고 있자니 어딘가 속은 느낌입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10년 뒤 어느 회사 다닐까 불안하다는데, 저는 10년 뒤에도 같은 회사에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공무원 경력으로 이직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남들은 철밥통이라는데 안에서는 진로 고민 하는 동료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답은 재테크다’로 결론이 흐르고 요즘은 다들 업무 시간에 주식 창 켜놓고 점심 시간에 돈 버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좌절을 느끼며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민원 갑질’을 참기도 쉽지 않겠지요. 2016년 입직자부터는 연금 제도도 개편돼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 수준으로 맞춰지니 오래 공직생활을 할 동기도 사라졌을 겁니다.
2021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결과’에서 만 13~34세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1.6%)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공기업(21.5%), 3위는 국가기관(21%)으로 나타났죠. 이 조사에서 공무원이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이었습니다.
글 jobsN 유소연
jobarajob@naver.com
잡스엔